[제180호] 김영회(무역 76학번)의 향가 이야기③
작성자 정보
- 편집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574 조회
본문

제망매가, 한계 앞에 무너지는 인간의 마음
제망매가(祭亡妹歌)는 신라 경덕왕 때(재위 742~765) 월명(月明)이라는 스님이 어린 누이가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만든 작품이다. 이 향가의 원문과‘향가창작법’으로 해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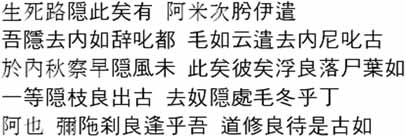
생과 사의 길에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나니. / 아미타불에게 ‘순서에 따라 누이를 보내겠다’고 했고, 누이도‘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했다네. /‘ 누이가 나에 앞서 죽는 것은 순서가 아닙니다’라고 아미타불에게 말씀 드렸으나 누이는 가고 말았다오. / 이른 바람이 아직 분 것이 아닌데도 떠올랐다 떨어져 이리저리 뒹구는 나뭇잎 같이 된다면 아니 되겠지. / 나뭇잎들이 같은 가지로 부터 나왔다 하지만 죽는 병에 드는 것은 순서에 따라야 하리. / 아미타불이여, 누이를 맞이해주오. / 나 불도를 닦으리라. / 아미타불께서 누이 맞이해 주기를 기다리고만 있다면 옳지 않으리.
한편 우리나라 최초로 향가를 연구한 양주동 박사는 이 작품의 한자를 소리글자로 보는 방법에 의거해 아래와 같이 풀었다.
생사로는 예 있으매 저히고, 나는 가난다 말도 못다 닛고 가나닛고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다이 / 하단 가지에 나 가는 곳 모르나니 / 아으, 미타찰(彌陀刹)에 맏보올 내 도 닦아 기다리고다.
양주동 박사는 누이의 죽음을 떨어지는 낙엽으로 비유하여 해독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면 생의 환희와 사의 비탄을 구분함이 없이 모두를 슬프다 했고,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누이가 죽는다는 말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었다’라고 죽음의 상황을 그리고 있으며, 이미 극락으로 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으로 갈지 모른다고 하는 등 내용에 있어 모순점이 적잖이 노출된다.
월명(月明)은 신라의 승려이자 향가 작가로 흔히 월명사(月明師)라고 부른다.
그는 제망매가에 앞서 향가〈도솔가(兜겢歌)〉를 지었다. 이 시를 짓게 된 경위는, 경덕왕 19년(760년) 어느 날 하늘에 두개의 해가 나타나 열흘이 지나도록 없어 지지 않는 변고가 발생하자 왕이 월명사에게 변고를 물리쳐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월명사는〈도솔가(兜겢歌)〉향가를 짓고 기도하여 이변이 사라지게 한 일이 있다.
신라 시대 승려들은 모두 당나라에서 들여온 한자(표의문자)로 된 불경을 공부했다. 따라서 당시의 고승 월명사도 자신의 의사를 뜻글자로서의 한문으로 표현했을 것이라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양주동 박사는 위 내용이 한자의 음을 이용하여 표기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해독했다. 그러나 우리말로 이루어진 작가의 의사를 한자의 음을 빌어 적
는다면 표현이 정확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일 것이다. 예를 들자면 첫 구절 ‘생사로는 예 있으매 저히고’를 한자로 옮긴다고 하면‘生死걟는 藝있으賣著히古’ 이런 식의 표기는 가능할 것이나 한자의 음만으로 풍부한 우리말을 다 표기할 수는 없다.
당시 지식인들이 과연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글을 썼을까?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다. 지금까지 한자의 소리로 향가를 해독한 연구자들은 우선 이 질문에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본 작품은 참척(慘慽)의 소멸을 기원하는 노래다. 참척(慘慽)이란 나이 어린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죽어 마음에 묻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슬픔을 뜻한다.
첫 구절에서 작가는 그 참척의 순간에 나름으로 생과 사의 길을 애써 관조하려 한다. 원래 유한한 수명을 가진 인간들은 생(生)의 환희와 사(死)의 비탄이 함께 드리워진 길에 무거운 발걸음을 끊임없이 걷고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객관화 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첫 구절의 한자‘차(此)’는 향가에서는‘계속 이어지는 발자국’이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불가(佛家)에 귀의한 그에게도 어린 누이의 죽음은 각별하였다. 누이의 목숨이 경각에 이르자, 남매의 애통함은 극에 이른다. 그는‘나이가 어리지 않느냐’며 아미타불에게 항의하였고, 병든 누이 역시‘죽고 싶지 않다’며 오빠의 옷깃을 부여잡았다. 하지만 모든 게 끝이었다.
가을 바람이 아직 불지도 않았는데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허망하게 누이는 가고 말았다. 떠나는 누이 앞에 선 오빠는 무력했다. 그는 떠난 누이가 극락에 갈 수 있기를 빌었다.
여기까지의 한탄과 호소는 속세의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는 불제자(佛弟子, 부처님의 제자)였다. 슬픔을 애써 누르고 스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려 했다. 아미타불께서 누이를 맞이해 줄 것을 소극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지않고, 더욱 열심히 불도를 닦아 누이를 극락에 보내고, 참척의 슬픔에서 벗어나리라고 다짐하고 있다. 그것이 누이의 죽음을 한 단계 더 승화시키고자 했던 신라시대 한 승려의 모습이었다. 승려지만 어떤한계 앞에서 잠시 허물어지는 인간의 마음이 묘사되어 있는 작품이기에 제망매가는 더욱 아름답다.(다음에 계속)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